 |
| 한승환 변호사 |
일반적인 경우, 건축주가 종합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건축주가 종합 건설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급인인 종합건설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종합건설사는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사에게 위 기성금 중 전문건설사가 공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불황이어서 종합건설사가 폐업을 하거나 회생 등을 할 경우,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즉 공사비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수급업자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으로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청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하수급인이 공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3자 간에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있었으나 공사를 마치고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등을 할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하수급인에게 희망이 생겼다. 대법원은 2025. 4. 3.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압류 이전에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만, 3자 간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 이전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었다면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압류 이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역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로 하수급인은 이전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회생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서둘러 직접청구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한승환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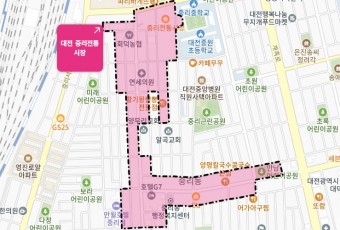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 동구 소프트테니스팀, 전국 최대 강팀으로 `우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10d/2026010701000443100017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