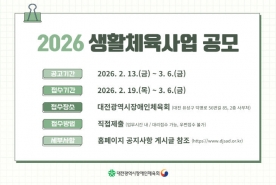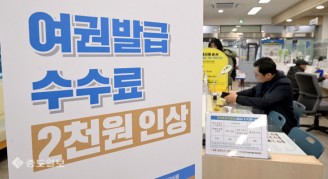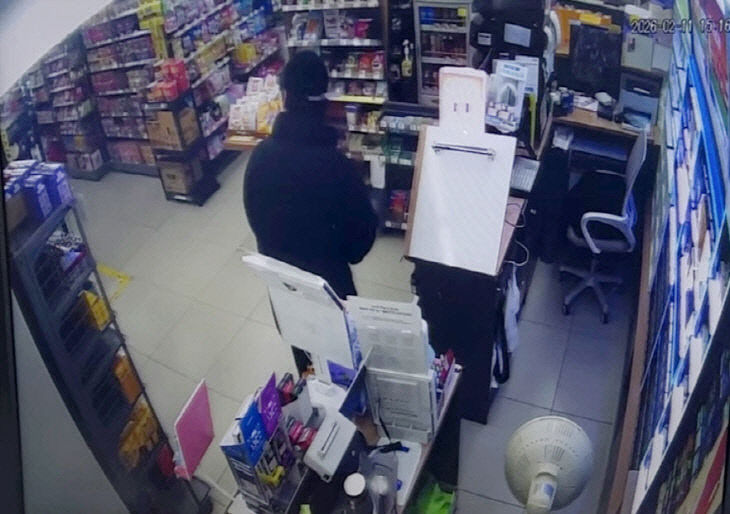|
| 오덕성 우송대 총장 |
도르트문트는 철강, 석탄 그리고 맥주산업의 3대 분야에서 60년대 말까지 번영한, '라인강의 기적'을 대표하는 독일의 공업 도시였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면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빼앗기고 석탄광산과 전통맥주양조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가면서 독일 평균보다 30%이상 실업률이 높은 문제지역이 되었다. 80년대 중반, 도르트문트 지역의 쇠퇴기를 벗어나기 위해 리더들이 힘을 모아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역혁신을 도모한 정책은 유럽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 선두에는 당시 도르트문트 대학의 총장인 펠징거(Velsinger)교수의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과 리더십이 있었다. 그는 지역의 정치가, 행정가, NGO들을 설득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쫓아가는 첨단산업 집적지역으로 도시를 탈바꿈 하여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펠징거 교수는 실리콘밸리를 중장기적인 지향목표로 하고 현 단계는 바다건너 영국의 캠브릿지에서 성공한 과학단지(Science Park) 모형을 도입하자는 수정제안을 했다.
도르트문트 과학·기술단지(Technology Park)라고 불리어지는 이곳은 도르트문트 대학 주변 자연녹지지역으로, 당시 420ha에 달하는 공지가 유럽의 5대 첨단 기술지역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였다. 초기의 혁신 허브로써의 계획은 대학과 주변에 입지해있던 공공연구소에서 일어나는 기술이전을 창업으로 이끄는 기술창업보육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로 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럽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다국적기업과 독일의 중견기업 연구센터를 입지시킴에 따라 점차 이 지역에 신기술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 기능들이 입지 하게 되었다. 도르트문트 대학에서 지역혁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첨단산업분야의 16,000여개 일자리와 15조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거점대학 및 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서 이 지역이 ICT, BT 등 양대 분야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Top 5 지역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도르트문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첫째는 거점대학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협력의 혁신생태계 창출이다. 지역대학이 배출한 고급 인력이 타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인재유출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도르트문트 과학·기술단지의 성공을 통해 지역대학 출신의 고급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고용되고, 일부는 스타트업에 종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역 착근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신산업 발전이 촉진됨에 따라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고, 타 지역에서 고급 인력들이 유입되어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되는 고급인력 풀이 형성되었다. 이른바 인재중심의 지역혁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본래 도르트문트 대학에는 의과대학이 없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쟁상대였던 이웃 도시 보쿰(Bochum)의 의과대학과 병원을 끌어들여 독일 연방의 의과학 분야 혁신클러스터에 도전하였다. 그 결과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지닌 베를린, 뮌헨과 더불어 독일의 3대 혁신 사업기지로 연방정부 과제에 선택된 바 있다. 이는 대전, 세종, 충남지역이 함께 초광역적인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우리 지역의 상황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집적지인 도르트문트가 '스타트업의 유럽 챔피언'으로 지역의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대전, 세종, 충남이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의 Top5 혁신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2m/26d/20260225010017621000760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