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은 직원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파견법이 적용되기에 사업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견 근로자 A 씨가 LH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2년 6월 25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용역업체 소속으로, LH 주택판매관리부에서 고객상담과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파견·용역근로자 전환시행 공고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심사 기준 60점을 넘지 못해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LH와 2018년 8월 1일 재계약한 A 씨는 전환심사와는 별개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파견법에 따라 첫 근무를 시작해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24일에 이미 고용의무가 발생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A 씨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가 LH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LH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한 점 등을 들어 A 씨를 파견법에 따라 최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7m/03d/돼지고기1.jpg)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7m/03d/78_20250703010003364000124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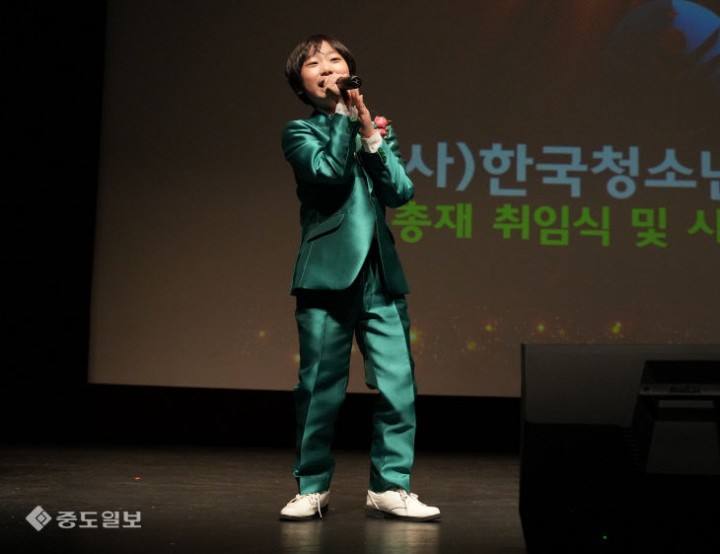
![[S석 한컷]10경기 2승 6무 2패! 냉정하게 판단한 2025 시즌 예상 순위를 물어 봤더니?](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7m/04d/2025070300151128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