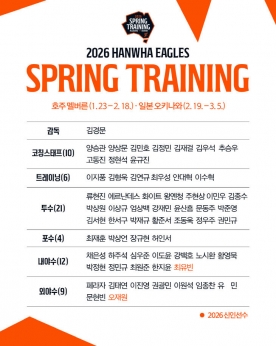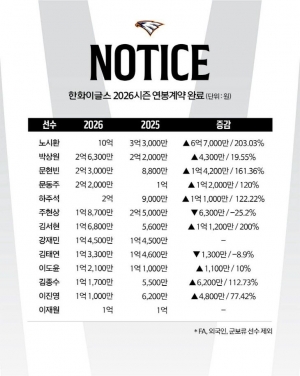|
다음 날 아침, 풀 위에 서리가 아직 내려앉아 있을 때 트랜즈알파인(TranzAlpine) 열차에 올랐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그레이마우스까지 약 5시간. 창밖에는 광활한 평원, 깊은 강 협곡, 눈 덮인 산맥, 그리고 수많은 터널과 다리가 이어졌다. 개방형 전망칸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풍경의 장엄함은 추위를 잊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차 여행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거칠고도 순수한 자연을 온몸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그다음 날부터는 7인승 캠퍼밴을 타고 11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경로는 크라이스트처치 → 테카포 호수 → 마운트 쿡 → 와나카 호수 → 퀸스타운 → 인버카길 → 오아마루 → 다시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오는 코스. 총 1,450km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 두 번 하는 거리와 비슷했다.
 |
아오라키/마운트 쿡에서는 뉴질랜드 최고봉을 눈앞에서 보았다. 타스만 빙하 트레킹은 헬리콥터로 시작됐다. 빙하 위에 내려 크램폰을 착용한 뒤, 푸른 얼음과 깊은 크레바스, 투명한 빙하수를 따라 걸었다. 발밑에서 얼음이 바스라지는 소리와 광활한 침묵이 온몸을 감쌌다.
퀸스타운은 겨울에도 활기가 넘쳤다. 곤돌라를 타고 밥스 피크(Bob's Peak)에 오르니 와카티푸 호수와 리마커블스 산맥이 한눈에 펼쳐졌다.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시원하게 펼쳐진 경치를 즐겼다. 한국에서도 루지를 타본 적이 있지만, 퀸스타운의 루지는 차원이 달랐다. 산허리를 따라 내려오며 매 순간 탁 트인 대자연과 마주했고, 뉴질랜드 특유의 거칠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더해졌다. 두 곳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었다.
 |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운이 좋으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이 바다에서 평생을 보냈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는 키위새와, 뉴질랜드 사람들이 '키위'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야기까지 나누었다. 키위 과일의 이름이 새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도 새로 알았다. 우리는 이틀 동안 오로라를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다림에 보답한다.
 |
겨울의 뉴질랜드 남섬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끊임없이 변하는 풍경 속을 달리는 일이었다. 얼어붙은 산길, 햇살 가득한 계곡, 서리 덮인 농지, 폭풍우 몰아치는 해안이 이어졌다. 길 자체가 곧 여행이었다. 무지개가 호수를 가로지르고, 눈이 언덕을 덮었으며, 양들은 들판 위를 떠다니는 구름처럼 풀을 뜯었다. 무엇보다, 나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따뜻함과 그 겨울의 잔잔한 고요를 오래 기억할 것이다.
명예기자 후한 (대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충남다문화뉴스 기자
충남다문화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