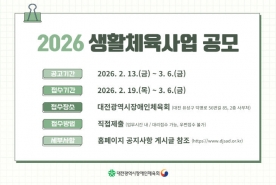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사실상 강제 전환하는 것은 당사자에겐 생존권 차원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장애인 돌봄의 산업적 육성과 고용 창출 또는 돌봄 기술이나 보건·복지 서비스 이전에 이 같은 나이 제한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 장애 정도가 나아진 것도 아닌데 기존 활동지원 내용이 하루아침에 쑥 줄어든다면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활동지원 연령 제한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AI·빅데이터로 맞춤형 관리한다고 공언하는 시대 조류에도 걸맞지 않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지만 비현실적이다. 실제 혜택을 받을 확률은 낮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틈을 메우려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집중이 어렵고 궁여지책밖에 안 되는 수가 많다. 장애인 복지 혜택을 고령화와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노령 장애인 증가 등 사회변화에 맞춘다고 할 때는 더더욱 역부족이다.
화살은 다시 입법 부작위로 향한다. 인권위의 법 개정 의견 표명 이전에도 몇몇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잠자고 있었다. 당사자가 서비스 종류를 직접 선택한다는 내용도 보인다. 불편함이든 생존 문제든 장애인을 활동지원의 사각지대에 둘 수는 없다. 장애인 삶의 질 보장에 투입되는 고비용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감당할 몫이다. 나이 제한을 두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부터 개정하는 게 순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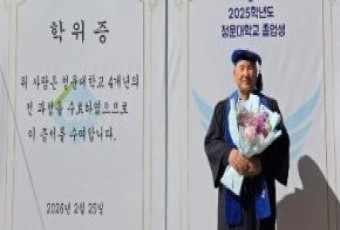











![[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3m/01d/20260225010017621000760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