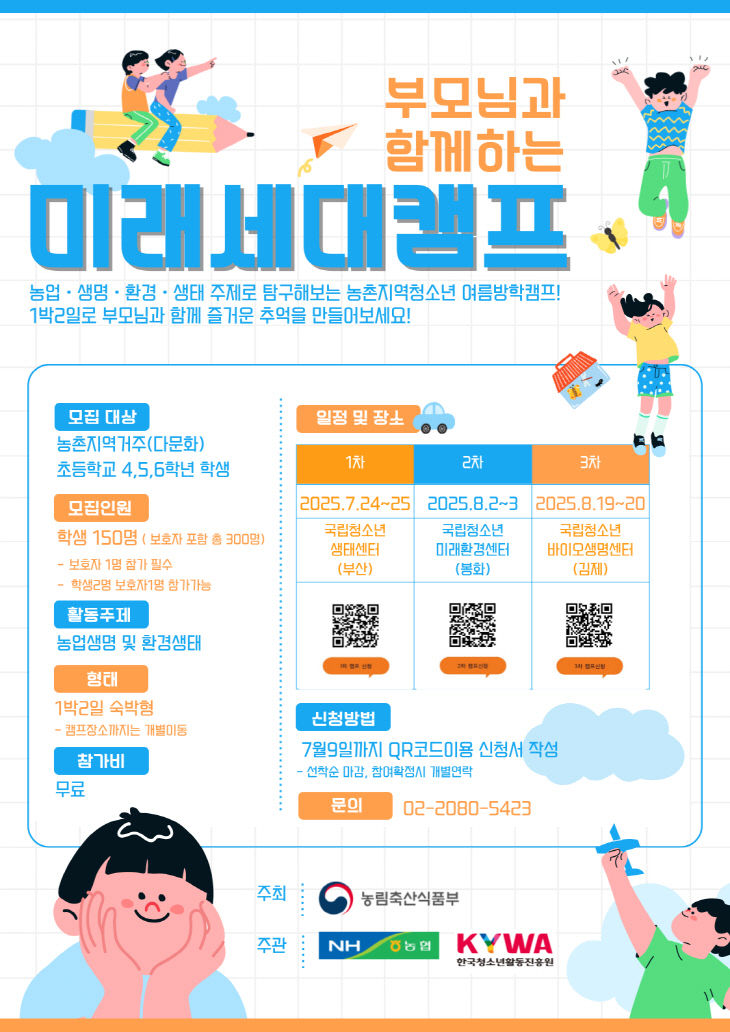|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일 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펴냈다. 개헌특위 활동에 참고할 자료다. 언론정보를 다룬 기본권 부문에 괄목할 만한 제안이 담겼다. '정보 기본권'을 신설한 것도 그 예다. 정보 기본권을 규정한 조문시안 제28조는 알 권리, 정보 접근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정보문화 향유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 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 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보 기본권'을 규정한 조문시안 제28조는 고쳐야 한다. 이 시안은 4항의 정보독점 부분을 빼면 2014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개헌 자문위원회 안과 거의 같다. 정보 기본권을 새 헌법에 신설하자는 데 동의한다. 반대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정보 기본권 도입에 찬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속성이 상이한 것들을 한 개념 우산 아래 묶어서는 안 된다. '정보'라는 외투를 걸쳤지만 1항의 알권리 및 정보 접근권, 2항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3항과 4항의 정보문화 향유권의 속성은 같지 않다. 3가지 다른 속성의 정보 기본권을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서 '정보 기본권'으로 명명한 셈이다.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속성의 기본권을 한 이름 아래 억지로 엮었다. 내적 정보와 외부 정보가 섞였다. 다른 것은 풀어서 제 자리로 가게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부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은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결정짓는 사항들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파악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훼손당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 정보는 정보주체 내부에서 생산된 정보다. 조문시안 제28조 2항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조문시안의 1항과 3항, 4항과 별도의 독립된 기본권으로 조문해야 할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개소한 것은 1988년이다. 그 직후인 1989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한다면서 알 권리의 역할에 대해 판시했다.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에 접근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자유를 '알 권리'라고 규정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헌재의 입장은 일관된다. 따라서 개헌특위 자문위의 조문시안 제28조 1항에서 규정한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은 동어 반복이고 간단히 '모든 사람은 알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조문시안 제28조의 1항 '알 권리'는 조문시안 제29조의 표현의 자유 조문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2항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별도의 조문에서 '새롭고 독립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학설의 취지에 부응한다.
그렇다면 조문시안 제28조는 3항과 4항으로 이뤄지고 이는 정보문화 향유권으로 정비될만하다. 이들 정보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기본권이 개인의 지적 재산권 행사와 충돌한 가능성은 있으나 개인의 지적 재산권 역시 한 공동체가 창출하고 전승해 온 지식과 가치의 결합물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구성원들과 공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문시안 제28조 4항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독점의 폐해 예방과 시정을 국가에게 의무지운 것은 타당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2항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28조의 3항, 4항과 독립해 새로운 기본권으로 조문하는 것이 정보 기본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우창희 기자
우창희 기자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7m/03d/돼지고기1.jpg)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7m/03d/78_20250703010003364000124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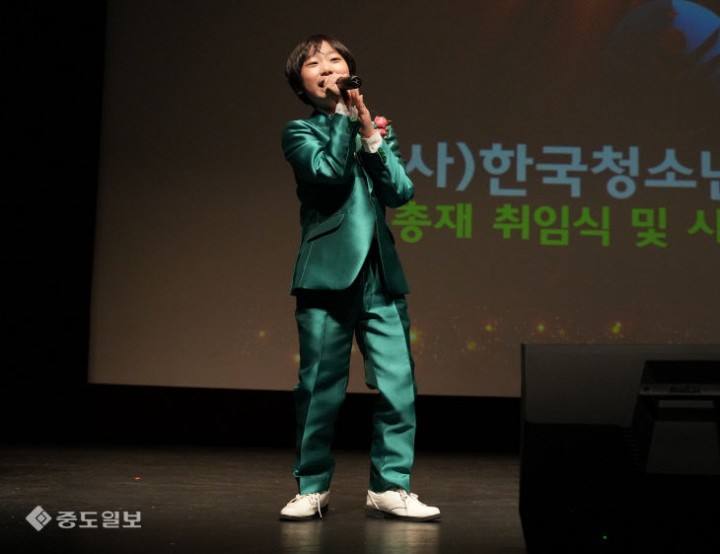
![[S석 한컷]10경기 2승 6무 2패! 냉정하게 판단한 2025 시즌 예상 순위를 물어 봤더니?](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7m/05d/20250703001511281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