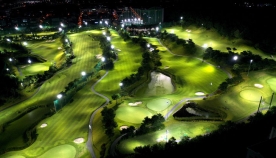|
|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작년 대전시 총인구가 150만 명 보다 줄었을 때, 언론뿐 아니라 시민들도 대전시가 가진 중요한 자산에 대한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다며, 한숨을 크게 쉬었었다. 한숨만 크게 쉰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간 가장 큰 폭의 인구 증가를 보인 세종시를 곁눈질하며, '빼앗긴 우리 시민을 어떻게 다시 빼앗아 올까'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최근 5년 간 인접 시도 간 전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대전세종 간 인구이동은 무척 빈번했다. 세종시 인구 증가에 대전시 젊은층, 특히 30대가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전시가 인구정책의 목표를 '빼앗긴 우리 시민 되찾아 오기'로 설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구정책의 방향을 인구 총량 증가로만 한계지운다면, 광양, 순천시와 같은 '웃픈' 사례가 우리에게 생기지 말란 보장이 없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각종 정책사업 지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와 세종시는 실제 대전세종을 빈번히 오가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생각과 생활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도시가 함께 활력을 만들어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더 생산적이다.
최근 우리 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주한 사람들, 특히 대전에서 이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세종 간 교류는 이주뿐 아니라, 교통 통행, 업무, 의료와 여가, 교육과 쇼핑 등에서 무척이나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이유로 약 30%의 응답자들은 "주택분양당첨 등 주택 구입"이라 말했다. 주택 구입과 함께 많은 응답자들은 지역과 주택·토지가 지닌 미래 투자가치를 이주사유로 꼽았는데, 새로운 도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큰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세종시는 새로운 계획도시답게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한 사람들은 세종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 '낮은 범죄율'이나 '잘 가꾸어진 산책로나 공원' 등의 주거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만족감도 컸다. 하지만, 세종으로의 이주 결과가 모두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젊은 20·30대는 생활 물가와 전·월세 및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불만이 컸다. 또한 규모를 갖춘 의료와 문화, 쇼핑 시설 부족과 대중교통 이용이 여전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세종이 아직 갖추지 못한 것들을 대전에서 채우고 있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양한 쇼핑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대전을 한 달 평균 이 삼일은 꼬박꼬박 방문하고 있었고, 한번 머무르면 평균 네다섯 시간은 대전에서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런 의료나 교육서비스, 혹은 여가문화 등을 즐기기 위해 여전히 수도권으로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 사람들은 마치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익숙하고 잘 아는 곳, 내가 이미 좋아하는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고 있었다. 이쯤 되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도시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두 도시를 활발하게 오가며 오늘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도시의 인구가 줄고 느는 것이 '심리적 저지선 무너지는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의 인구 총량 증가'담론을 거두어야 할 때인지 모른다.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 발전 모델, 교통과 문화,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이미 하나의 생활권인 대전세종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을 계획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가 아닐까.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드림인대전] 초등생 윤여훈, 멀리뛰기 꿈을 향해 날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8m/28d/드림인대전1.jpeg)









![[드림인대전] 초등생 윤여훈, 멀리뛰기 꿈을 향해 날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8m/28d/20250826010018644000791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