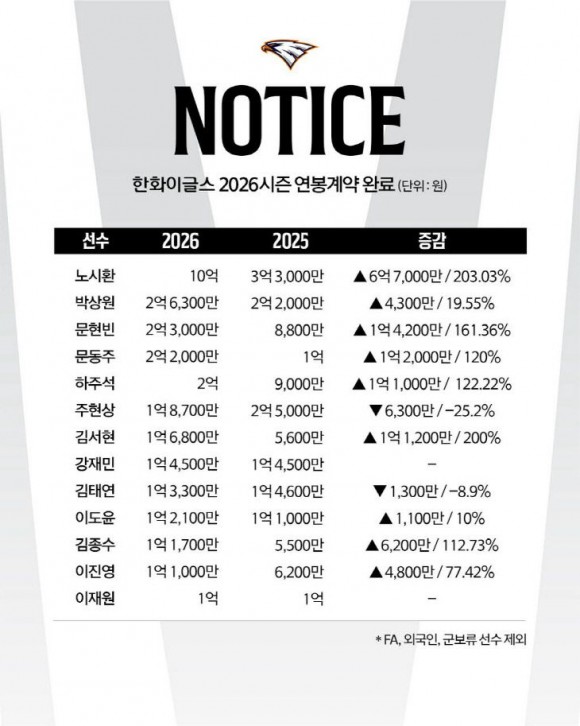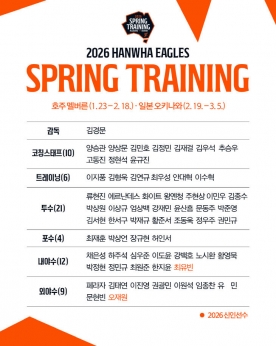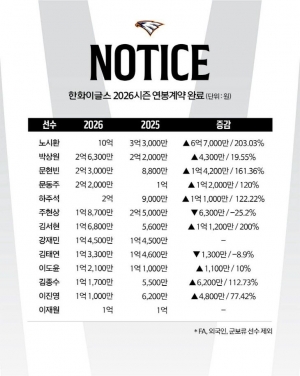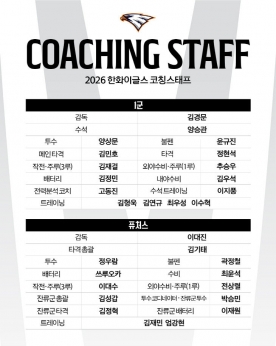|
|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그럼에도 아직 사물적 관점의 문화재에서 역사적 정신적 관점에서의 '유산'이 정립되지 않아 완전한 시대전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혼동되어 정부 정책이 지체와 정체를 거듭하면 결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을 되돌려주는 일이 지체되고 있고 박물관 가득히 쌓아놓은 유물의 가치 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해 주는 것'이다.
이로써 1962년 만들어진 기존의 법령 폐지 한 달을 앞두고 긴급하게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유산법으로 대체되어 문화재 보호의 시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향유 시대로 전환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재산적 가치에 중점을 둔 문화재에서 역사적 자산이자 공동체의 유산으로 가치를 두고 미래세대에 가치 있게 전승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점(點) 단위의 보호 위주 정책에서 유산의 역사와 환경을 반영한 면(面) 단위로 정책을 전환함으로 유산의 탄생 내력과 밀접한 지역 공동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박물관에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관성을 강제로 떼어놓은 국가유산이 많이 있다. 국보 안동 하회탈의 사례로 국립박물관에 조사연구 목적으로 대여하고 안동에 보존할 박물관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지체하다가 53년만인 2016년에 귀향한 바도 있지만, 원주 흥법사 염거화상 사리탑, 김천 갈항사지 삼층석탑, 서산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 등이 국립박물관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옮긴 것은 조선총독부 때이었는데, 국립박물관은 적산을 물려받아 오늘날까지 원상회복하지 않고 대물림하고 있는 셈이다.
국립박물관은 2017년 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지방박물관으로 이관하여 '지역대표 브랜드'로 키울 것이라고 했고 일부를 이관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대표 브랜드는 정작 돌아가지 않고 숱한 기와, 그릇 등으로 숫자를 채웠다는 점이다. 마치 1965년 일본과의 문화재협정에서 개수를 부풀리기 위해 짚신(초혜), 막도장 등으로 키워 넣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일례로 서산은 대표적인 철기 문명의 지역이다. 발굴한 야철지가 15곳이 넘을 정도이고 백제 칠지도를 서산 지곡면에서 제작했다는 학계의 발표가 있다. 2미터가 넘은 거대한 보원사 철불은 고려 개국초 제작한 것으로 서산의 철기 문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서산의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지금도 제철 사업이 활발한 이 지역의 산업이 오랜 역사와 연결됐음을 증명한다. 그러함에도 국립박물관은 점 단위 보호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고 유산의 가치를 손상하고 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2022년부터 청소년 문화유산 실감교육을 하면서 '더 많은 유산'을 '더 오래' 보여달라는 미래세대의 요구에 답을 구하기 위해 해외 소장자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 수장고에는 같은 종류의 토기와 와당, 도자 등이 즐비한 것을 보면서 '미래세대에게 더욱 가치 있게 전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국립박물관과 정부는 답을 내놓기 바란다. 아직 '국가유산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