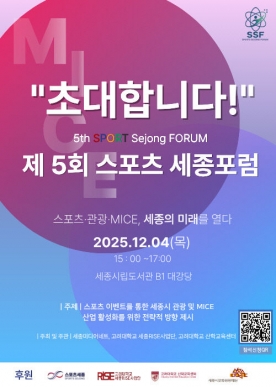|
| 강병호 배재대 교수 |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는 알타이계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분류되며, 몽골어·튀르크어·만주어 등과 같은 계통으로 연결된다. 이는 역사적·문화적 유사성뿐 아니라 언어적 친연성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반면 중국어는 알타이계 언어와는 문법 구조·어휘·발음 체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국이 문화·정서적으로 중국보다 알타이 문화권과 더욱 가깝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복합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에너지·광물의 해외 의존 심화, 지정학적으로 고조되는 중국의 압박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0년까지 약 25%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한미동맹 유지'나 '대 중국 관계'만으로는 생존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인구·자원·안보·외교 네 축을 종합한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중장기 연합 구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알타이 연맹(Altai Alliance)' 구상이다.
알타이 연맹은 대한민국을 주축으로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등 국가들을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며, 총인구 약 1억 6250만 명 규모의 중견 다자연합체다. 이들은 유라시아 대초원(Steppe Belt) 문화권에 속하며, 고대 흉노·돌궐·위구르·몽골 제국의 중심지로서 중국 왕조와의 역사적 대립과 교섭을 반복해 왔다.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의 후예로 중앙아시아와 언어·문화적 기반을 공유하고, 헝가리는 아시아 유목민 계통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가진다. 이런 역사·문화적 공통성은 오늘날에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경계심과 자주 외교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부르며, 6·25 전쟁 당시 보여준 군사적 지원과 희생을 양국 관계의 토대로 삼고 있다.
인구 구조에서도 협력 잠재력은 크다. 한국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는 반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은 35세 이하 청년층 비율이 60% 이상이다. 이 청년 인구는 산업·기술·자본과 결합할 경우 제3의 성장 경제권 형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교육, 청년 창업 지원, 기술훈련센터 설립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양측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자원 분야에서도 시너지가 크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2%이며, 전략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과 호주에 의존한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몽골은 희토류 부존량이 풍부하며, 튀르키예는 가스관을 통해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한다.
안보 협력 가능성도 높다. 한국은 2024년 세계 6위 방산 수출국으로, 헝가리와 튀르키예는 이미 한국산 무기 도입·공동생산을 논의 중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기술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무엇보다 알타이 연맹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지정학적 균형축이 될 수 있다. 일대일로 참여국 일부는 부채와 정치 개입에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은 AI·K-콘텐츠·그린 에너지·스마트 의료 등 비강압적이고 기술 중심의 파트너십을 제공함으로써 대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해선 정부의 전략 수립, 국회의 초당적 네트워크, 산업계의 시장 분석과 투자 계획이 필수다. 초기 단계부터 공동 프로젝트와 파일럿 사업을 운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타이 연맹(AA)은 국가 생존과 국제 영향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강병호 배재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기획취재]농산물 유통과 전통주의 미래, 일본서 엿보다-2](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4d/117_20251203010003092000112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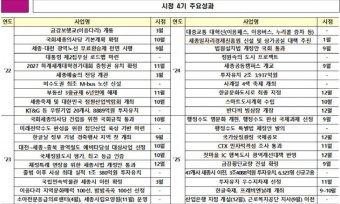




![[르포] 일본의 가락시장 도요스, 유통 시스템은 정반대?](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78_2025120301000308900011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