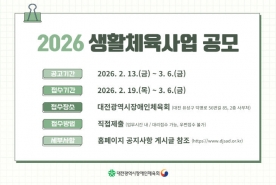|
오는 8일 마지막으로 중1과 초5~6학년이 등교에 합류하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지 99일 만이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패러다임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전환의 핵심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변화에 있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공교육은 출석만 체크할 뿐 공부는 사교육으로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감염병은 공평(?)하게 개인과외, 학원가에도 덮쳤다.
코로나 펜데믹 시대, 공교육의 역할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학교가 지식 전달을 위한 교과 교육뿐 아니라 자율과 협력을 통한 창의적 '혁신교육'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변화하는 세종 혁신학교는 집단 지성을 통해 공동으로 답을 찾아가는 학교다. 함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위기극복도 가능하다는 믿음이 반짝인다.
반면, 혁신학교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도 있다. 가장 먼저 '혁신'이라는 단어안에 포함된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다. 모든 학교에 열려있는 혁신학교 신청이 높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도 강하다. 모든 연구결과가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음을 향하고 있지만 입시를 걱정하는 고교생 학부모의 거부감은 여전하다. 지난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리포트에 따르면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보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업 성장률이 더 크고 중위권의 하락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층위별로 고른 성장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실제 고교 혁신학교인 소담고는 2020학년도 수시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변화와 혁신이 교육에 맞지 않다는 생각은 교과중심 기성세대들의 오래된 편견이다.
학부모 반대에 직면한 교사들의 부담감도 있다. 혁신학교에선 스스로 계획·운영·평가해야 하지만, 근거는 명확해야 하니 마음이 무거울 게다. 하지만 혁신학교를 경험한 교사들은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교육과정의 주인공으로 자부심을 내보였다.
올해 초 '학교자치를 부탁해2'로 네 번째 책을 펴낸 소담초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명제를 마주해 본다.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과 최탁 장학관은 "혁신학교가 처음에 힘을 받을때를 돌이켜보면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이 주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지지를 받았다"며 "하지만 어느 순간 혁신학교 숫자가 몇 개인가, 어느 지역에서 한다더라 등의 정책적 판단들이 관심의 중앙에 서면서 오히려 힘을 잃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혁신예비학교 5곳, 혁신학교 13곳, 혁신자치학교 7곳 등 25곳의 자치학교를 운영한다. 혁신학교 4년을 종료한 학교를 대상으로 '혁신자치학교'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혁신교육이 일반화되도록 성과를 공유한다.
이달 중 혁신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열고, 하반기 개교되는 해밀 초·중·고에는 '혁신미래교육체제'가 시범 도입 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
지난 날 우리는 교육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이 가능하다 믿었지만,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020년 현재 공교육에 대한 기대가치는 무엇일까?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교육에 대한 진짜 혁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미선 세종본부 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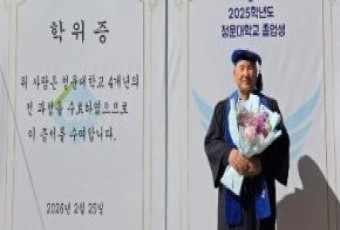











![[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3m/01d/2026022501001762100076071.jpg)